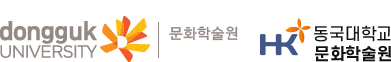[연구진 섹션]
당상(糖霜)으로 본 동아시아 설탕의 역사 Ⅱ
-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5-10-22 19:09:55
조회수446
당상(糖霜)으로 본 동아시아 설탕의 역사 Ⅱ
HK + 사업단 HK연구교수 이완석
한반도는 기후 문제로 사탕수수 재배가 불가하였고, 대신 꿀이나 조청(造淸)을 감미료로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도 설탕을 사용한 흔적이 문헌에서 발견되는데, 그 최초 기록은 고려시대 문인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파한집(破閑集)』에서 보인다.
(승려) 혜소(惠素)가 그것(왕이 하사한 백금)으로 모두 사탕(沙糖) 1백 덩어리를 사서 살고 있는 곳의 안팎에 늘어놓으니,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말하기를, “이는 내 평생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므로, 만일 내년 봄에 상선[商舶]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것을 구할 것인지에 대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인로(李仁老), 『파한집(破閑集)』
고려 대각국사 의천의 제자였던 승려 혜소의 사례인데, 혜소가 설탕을 기호품으로 즐겼으며, 그 설탕은 가격이 비싼 수입품이었음을 암시하는 일화이다. 조선 시대에도 설탕은 매우 귀한 수입품이었으며, 주된 수입지는 중국이었다. 조선 초에는 조공의 답례품으로 혹은 중국 사신의 선물로서 설탕이 유입되었다.
(명나라 사신) 황엄(黃儼)이 반인(伴人)을 보내어 사탕 한 그릇[器]과 금금(衿錦) 1단(段)과 상아 젓가락 20쌍(雙)과 겸철토환흑광조대(鉗鐵吐環黑廣條帶) 1요(腰)를 바치었다.
『태종실록』 태종 17년 7월 17일
정원(政院)이 "두 천사(天使)가 통사(通事)를 시켜 사탕을 보내오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길에서 먹는 음식으로 변변찮은 물건입니다만 전하께서 기재(忌齋)가 계신다기에 올립니다. 쓴 글씨가 몹시 졸렬하나 역시 보냅니다."고 아뢰었다.
『중종실록』 중종 34년 4월 14일

[사진] 흑설탕
출처: 위키피디아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선 왕실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역관(譯官)을 시켜 설탕을 수입하였다. 영조 44년(1768) 의주 수검소(搜檢所) 수입품 목록인 『용만지(龍灣志)』에도 잡당(雜糖)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세량이 15냥인 것으로 보아 수입액은 500냥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외에 류큐(琉球)와 일본에서도 수입했으나 그 수량은 중국보다 훨씬 적었고 일정치 않았다. 류큐에서는 1477년 100근, 1480년 100근, 1494년 후추와 설탕이 든 항아리 1개 등을 조공품으로 바쳤다. 일본에서도 1642년에서 1662년 사이 쓰시마 도주(對馬島主)가 예물로 설탕이나 설탕으로 만든 과자류를 몇 차례 보냈으나 대개 20근 안팎의 소량이었다.
설탕이 고가의 사치품으로 인식되었기에. 조선에서는 설탕 수입을 금기시 하였고 적은 수량의 설탕이 희귀한 약재로서 사용되었다. 워낙 구하기 어려운 물품이었기에 왕실 구성원이 병들었을 때조차도 쉽게 먹을 수 없었다.
소헌왕후(昭憲王后)가 병환이 났을 적에 사탕을 맛보려고 하였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이 이를 올리는 이가 있으니, 임금(문종)이 이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친인 소헌왕후를 모신 혼전(魂殿)인) 휘덕전(輝德殿)에 바치었다.
『문종실록』 문종 2년 5월 14일
조선 후기에도 설탕은 여전히 귀한 약재로 사용되었다. 숙종 때 편찬된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파두(巴豆)와 석약(石藥) 등의 독을 해독할 때, 잘못해서 물건을 삼켰을 때, 천연두에 걸렸을 때 다른 약재와 함께 설탕을 복용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1786년 조선 정부에서 반포한 홍역 처방에도 설탕이 들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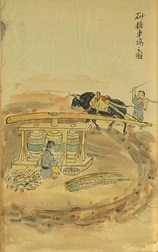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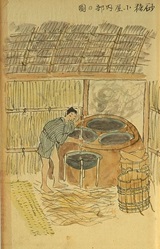
[그림] 일본 메이지 시대 설탕제조 방법
출처: 위키피디아
일본은 은(銀) 교역으로 인해 아시아 해상무역 체제에 포함되었다. 센고쿠시대(戰國時代)인 15~16세기부터 은과 구리를 수출하고 비단‧인삼‧설탕과 같은 사치품을 수입하였다.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상인이 중국이나 자바의 설탕을 수입해서 나가사키(長崎)에서 판매하였다. 1711년 무렵 일본은 중국에서 4,480,000근의 설탕을 수입했다. 일본 사쓰마(薩摩)에서는 17세기 중엽 이후 류큐로부터 공미(貢米) 대신 설탕을 받았다. 18세기 초 에도(江戶) 막부의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은과 구리의 수출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는 설탕‧인삼 등 사치품 수입을 줄이고 자급하려는 정책이었다. 이 조치 뒤 일본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였고 사누키(讃岐)에서 설탕을 생산하였으나 그 양이 매우 적었다. 여전히 설탕은 상류층이 즐기는 사치스러운 음식 재료로 사용되었다. 일본에 파견된 조선 사신은 설탕 과자류를 대접받은 것을 매우 즐거워하였다. 사신이 남긴 기행문에 따르면 그들은 빙당을 비롯해 설탕으로 만든 병과류인 오화당(五花糖). 당병(糖餠), 화당(花糖)을 접대 받았다. 조선 사신들이 설탕을 많이 접하다 보니, 1719년 신유한(申維翰)은 『해유록(海遊錄)』에서 모든 일본 음식에 설탕이 들어간다고 착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설탕은 사치스러운 수입품이었고, 이들이 설탕을 자주 먹었다는 것은 일본이 조선 사신을 그만큼 융숭하게 대접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설탕은 그 깔끔한 단맛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랑받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특정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사탕수수를 이용해 설탕을 생산하고 이를 전 지구적인 규모로 유통하였다. 특히 중국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의 설탕 생산이 이뤄졌고 중국 설탕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수출되었다. 19세기 초 중국에서는 설탕이 비단, 차와 더불어 중요한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설탕 생산은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인 제당기술을 갖추게 된 영국이 아시아 무역 허브인 홍콩에 정제당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18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설탕의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고, 전통적인 동아시아 설탕무역체제는 서구가 주도하는 무역체제로 재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