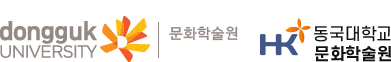[연구진 섹션]
무섭지 않은 호랑이, 스라소니 Ⅰ
-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5-01-07 13:16:53
조회수4342
무섭지 않은 호랑이, 스라소니 Ⅰ
HK+ 사업단 HK연구교수 정상호
스라소니란 食肉目 고양이과의 포유류이며 '링크스(Lynx)'라고도 한다. 몸길이는 약 85-130cm, 꼬리길이는 약 12-24cm이며 體高는 50-75cm, 몸무게는 18-38kg에 달한다. 표범보다는 작지만 다른 고양이과 동물보다는 큰 편에 속한다. 스라소니의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큰 머리와, 호랑이에게서 볼 수 있는 볼수염이 있다. 털은 짧은 세로의 줄무늬와 둥근 반점이 섞여 있고, 귀는 삼각형이고 귀 끝에 안테나같이 검은색 털이 뾰족하게 나와 있다. 이 뾰족한 검은 털은 소리의 방향을 탐지하고, 먹이의 고주파를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스라소니를 구분하는 특징적인 요소이다. 귀의 뒤에는 담회색의 반점이 있고 귀에서 목까지 긴 털이 있다. 앞다리에 비해 뒷다리가 비교적 길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바닥이 넓고 발가락 사이에는 잔털이 있다. 꼬리가 짧고 통상 몸 전체 길이의 1/4을 넘지 않으며, 꼬리의 1/3이 검은 색이다.
스라소니의 서식지는 매우 다양하다. 해발 100m의 평원에서 해발 5000m의 고원지대에 걸쳐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한반도 북부․몽골․러시아의 시베리아 등 동유라시아대륙 북부 전역에 걸쳐 분포한다. 한반도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평안도와 함경도에 많지 않은 개체가 서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스라소니. 출처 : 위키백과
서식지로는 주로 깊은 숲을 선호하지만 산악 지대의 암반 절벽이나 덤불이 무성한 평원에서도 살아간다. 고양이과 동물답게 단독 생활을 하며 성질 또한 사나운 편이다. 스라소니는 나무를 오르는 능력이 탁월하며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다른 소형 고양이과 동물들처럼 작은 동물만을 사냥하지 않는다. 노루와 고라니 등은 물론이고, 드물게는 어린 멧돼지도 단독으로 기습해 사냥이 가능하다. 물론 쥐, 토끼와 같은 작은 먹잇감들도 잡아먹는다.
스라소니는 ‘작은 호랑이’, '못생긴 범 새끼' 등의 별명이 있으며 조선에서는 토표(土豹), 대산묘(大山貓)라고 불렸다. 최덕중의 『연행록(燕行錄)』에서 조선시대 스라소니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다.
… 길에서 함거(檻車) 둘을 만났다. 하나는 시랑(豺狼) 두 마리를 실었는데, 모양은 곰 같으나 낯짝은 개 같고 크기는 중간치 돼지 같았다. 또 다른 하나에는 스라소니(土豹) 한 마리를 가뒀는데, 모양이 작은 표범 같았다. 혹자는 범이 처음 낳은 새끼는 범이 되고, 두 번째 낳은 새끼는 표범이 되며, 세 번째 낳는 새끼는 스라소니가 된다고 한다.